이순형 동신대 전기공학과 교수 발표
출력제한 해소·송전망 투자 절감·RE100 산업단지 수요에 ESS 시장 성장 전망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재생에너지가 늘면서 남는 전기를 버려야 하거나 전력망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커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핵심 수단이 ESS(에너지저장장치)다. ESS 시장은 RE100 산업단지 실현과 송배전망 투자 절감 효과까지 아우르며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K-BATTERY SHOW(케이배터리쇼) 2025 중 한국EV기술인협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RE100 산업단지의 ESS적용 사례’ 주제 연자로 나선 이순형 동신대 전기공학과 교수(학과장)가 한 말이다.
이 교수는 “원자력이나 화력은 터빈이 돌아가면서 관성이 생겨 발전 주파수(전력망의 진동수로, 60헤르츠±0.2 범위 유지가 안정성이 높다)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성이 유지되지만 태양광과 풍력 등은 자연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고 인버터를 거쳐 계통에 연결되기 때문에 관성을 유지해 주는 장치가 없어 주파수가 민감하게 요동친다”며 “이런 상황에서 ESS는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방출하는 방식으로 전압과 주파수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해 전력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장치”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11차 송배전설비계획을 언급하며 2038년까지 해저에 8GW, 육상에 20GW 송전선을 새로 깔기 위해 약 73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ESS를 적극 도입하면 이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재생에너지가 집중된 지역에서 전기를 곧바로 소비하도록 분산 배치하면 수도권으로 전력을 올리기 위한 막대한 송전 투자를 피할 수 있다”며 “전라남도·전북·광주·제주 등 호남권 전체 부하(해당 지역에서 실제 사용하는 전기 양)가 5.3GW 수준인데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이 11GW에 달해 출력제한(발전은 했지만 송전망에 다 실을 수 없어 일부 전기를 버려야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송전선로 수용 능력이 4.5GW에 그치다 보니 실제로는 전체 부하의 약 1%가 차단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ESS와 RE100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등을 설치해 남는 전기를 현지에서 직접 쓰게 하면 전력망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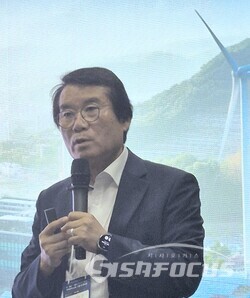
현재 한전은 순차 송전 방식을 적용해 동일한 선로 용량을 시간대별로 나눠 활용하고 있다. 한 예로 22.9kV 배전선은 한 번에 약 20MW까지 수용할 수 있는데, 발전소들이 순서를 정해 전력을 흘려보내면 과부하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이 급격히 늘면서 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 교수는 한계를 보완할 방법으로 공동 접속을 제안했다. 여러 발전 설비를 병렬로 묶어 개별 출력 상한을 제한하고, 남는 전력은 ESS가 저장해뒀다가 순차적으로 내보내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순차 송전을 공동 접속 형태로 운영하면 동일한 선로에서도 최대 6배까지 발전량을 담아낼 수 있다”며 “발전량이 몰릴 때 ESS가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순차적으로 내보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예컨대 PCS(전력변환장치)를 4MW로 제한해 다섯 개를 묶으면 선로에는 항상 20MW만 흐르지만 ESS가 남는 전력을 받아 저장하고 다시 방출하면 실제 연결 용량은 다섯 배까지 확대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국내 재생에너지를 전부 조사해 공동 접속 방식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 송전선을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2~3년 안에 20~30GW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고, 투자비 회수 기간도 약 5년으로 산출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