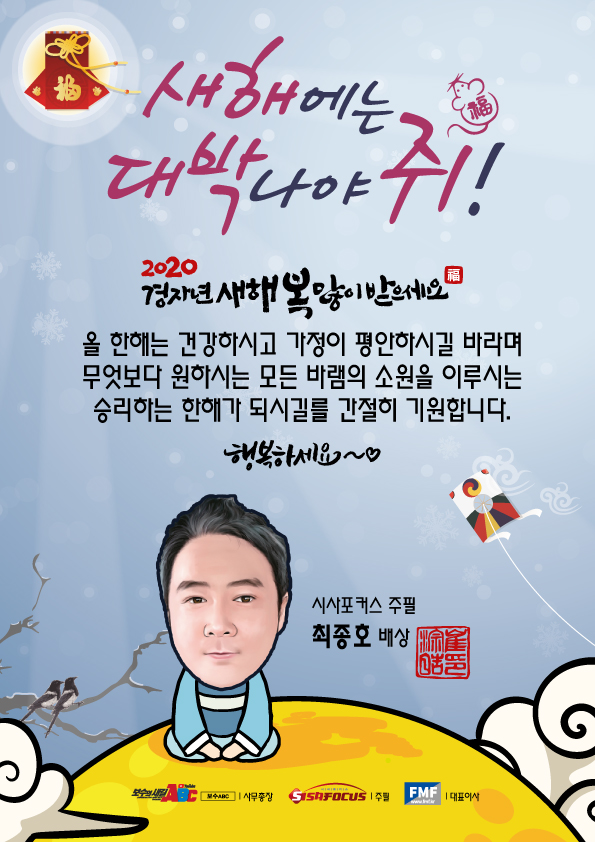
어릴 적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 전지적으로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러한 생각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고, 나의 얕았던 지식수준은 이전보다 한층 깊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되어 타인 앞에 돋보이고 싶다는 욕망은 있었지만 세상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노력과 끈기의 부족으로 남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는 되지 못했고 남들이 인정할 만한 성공도 하지 못했다.
옛말에는 재주가 많으면 빌어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중에 하나는 터진다고들 한다. 여전히 한 우물을 파야만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들어 융합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 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대사회에선 전문가들과 매스미디어, 소수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마치 전지전능한 것처럼 생각되고 대중들은 열광하기도 한다.
과연 전문가들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어려운 이 시대에 구세주가 될 것인가?
김광웅 교수가 엮은 ‘우리의 미래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오히려 전문가에 대한 맹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전문가의 사전적 의미는 전문적으로 문외한인 사람들, 혹은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정의된다. 전문가들은 자기 전공 분야에 매몰되어 타 분야에 대한 이해는 물론 소통과 교감도 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하고는 한다.
한양대 유영만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파리학과’에 빗대어 전문가들을 ‘전문바보’라 칭하는 것이다.
학문을 세분화하다 보니 파리의 몸통공부를 하고 나서 파리의 다리를 연구하는 식의 세분화, 고착화 되는 우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김광웅 교수는 학문 간의 소통이 어려워지는 현실에 과학 기술을 알아야 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심미안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편협한 관점은 그릇된 결과를 초래하기 쉽기에 학문을 배우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로는 한 분야에 전문가도 되어야 하지만 하버드 대학의 사회 생물학자 Edward wilson의 저서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즉 ‘통섭’으로 번역되는 학문들을 통관하는 이론과 사실들을 상호 연계하여 지식체계를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해 현상을 볼 때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숲을 살피라는 성현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다. 넓게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현실에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소통을 통해 창의성을 도출해야 하고, 그것을 개인들이 각성하고 나눔(share)에 의해 전파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즉 지식을 대통합하고 통합된 지식을 마이닝(분석)하고 취합하여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을 신격화하고 흉내 내는 것보다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Kobert Frank교수의 ‘Economic Thinking’은 내게 있어 외계인(E.T)과 같은 느낌의 책이었고 용기와 공감을 주었다. 쉽지만 체계적이고 실생활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석학들의 사유를 단순하게 짜깁기한 것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전문가들의 전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학문들을 일반 필부들과 중고생들이 읽어도 무방할 정도의 설명으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처럼 2020년 경자년의 많은 지도자들 역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지성 자크 아탈리가 이야기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자세를 지니고 마더 테레사수녀가 ‘나는 대중을 구하기 원하지 않는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관자(bystander effect)가 되기보다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고 뭔가를 성취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모든 이들에게 만복이 가득한 경자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